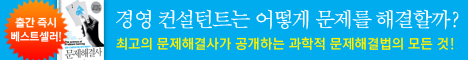여러분이 학창 시절로 돌아가 다시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20명이 한 반으로 편성된 고사장과 60명이 한 반인 고사장 중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유리할까요? 자기 실력으로 치르는 시험이라서 한 반에 타 수험생들이 몇 명이 있든지 '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스테펜 가르시아(Stephen M. Garcia)과 아비샬롬 토르(Avishalom Tor)는 가능하다면 인원수가 적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가르시아와 토르는 2005년에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SAT(미국의 수학능력시험)의 점수 분포, 수험생 수, 고사장 개수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개인 소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 예산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수가 많을수록 SAT 점수가 낮다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르시아와 토르는 이렇게 같은 과제나 게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나 많다고 인식할수록 성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컬어 'N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N이란 수를 의미하죠.

실험실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N효과가 증명됐습니다. 가르시아와 토르는 74명의 대학생들에게 시간 제한이 있는 8개의 간단한 퀴즈를 풀도록 했는데(4개의 다지선다형, 4개의 진위선택형),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10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해서 문제를 모두 푸는 데 걸린 시간이 상위 20퍼센트에 해당될 경우에 5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경쟁자가 100명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죠. 그랬더니, 경쟁자가 10명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학생들이 '100명 조건'의 학생들에 비해 확실히 퀴즈를 빨리 풀었습니다(28.94초 대 33.15초). 이는 경쟁자 수(N)가 많아지면 경쟁하려는 동기가 떨어진다는, N효과를 정확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후속실험에서 가르시아와 토르는 47명의 학생들 중 절반에게 "당신과 달리기 실력이 비슷한 50명의 경쟁자와 5킬로미터 경주를 치른다고 상상한다면, 당신은 평소보다 얼마나 빠르게 달릴 것 같은가?"라고 물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절반에게는 500명의 경쟁자와 경주를 벌이는 상황을 상상하게 했죠. 학생들은 '500명 조건'일 때보다 '50명 조건'일 때 더 열심히 달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쟁자 수가 많아지면 실력이 저하되고 열심히 하려는 동기도 떨어지는 이유, 즉 N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르시아와 토르는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추가분석에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N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이는 N효과를 일으키는 메커니즘과 사회적 비교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일러줍니다.
단순히 경쟁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동기가 저하된다는 N효과를 감안한다면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한 팀으로 묶을 경우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한 팀에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물리적으로도 한 사무실에 많은 직원을 모아 놓는 것도 효과적인 관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또한 직원들의 성과를 높일 목적으로 경쟁자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은 오히려 직원들의 동기를 저하시킬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논문)
Stephen M. Garcia, Avishalom Tor(2009), The N-Effect: More Competitors, Less Competition, Psychological Science, Vol.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