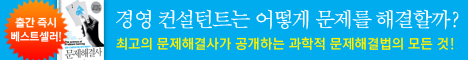여러분이 하는 일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일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생계를 위한 목적 외에는 그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삶의 낙오자가 된 듯한 열패감이 휩싸일 겁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한 매개체이자 자아실현의 표현물이기 때문입니다. '인정'과 '일의 의미'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을 수행하려는 동기를 구축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요소가 옅어지거나 사라질 때 직원들의 생산성은 현저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과 일의 의미라는 두 가지 동기 요소와 '유보 임금(reservation wage)'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유보 임금이란 직원들이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으로 받으려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자신의 업적을 인정 받지 못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가?'라며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 직원은 자신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크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정 받고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 비해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행동경제학자인 댄 애리얼리(Dan Ariely)와 동료들은 업적을 인정 받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유보 임금이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MIT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실험은 글씨가 적힌 한 장의 종이를 주고 연속해서 s가 두 번 나오는 경우를 10개씩 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첫 페이지를 완성하면 55센트를 주었고, 두 번째 페이지를 끝내면 50센트를 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과제를 완성하면 수고료가 5센트씩 줄어들도록 했는데, 학생들은 언제든지 일을 그만하겠다는 표현을 실험진행자에게 할 수 있었죠.
학생들은 눈치 채지 못했지만, 애리얼리는 학생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인정 그룹'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페이지를 건네 받을 때마다 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했고 나중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폴더에 보관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무시 그룹'의 학생들은 이름을 쓰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거니와 과제를 완료한 이후에 한쪽 구석에 쌓아 놓기만 할 뿐 연구자들이 따로 검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죠. 마지막으로 '세단 그룹'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실험진행자의 '만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완료할 때마다 살피지도 않고 곧바로 문서세단기에 밀어넣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애써 수행한 일이 잔인하리만큼 무시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했던 겁니다.
실험 결과, 인정 그룹의 학생들이 완료한 일의 양이 9.03페이지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시 그룹과 세단 그룹은 각각 6.77페이지와 6.34페이지였죠. 노동의 결과가 무참히 잘려나가는 모습을 봐야 했던 세단 그룹의 학생들이 가장 먼저 포기를 선언했던 것이죠. 이로써 각 그룹의 유보 임금 수준은 애초에 세웠던 가설과 반대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따져 보면 인정 그룹의 유보 임금은 14.85센트인 반면, 세단 그룹은 그 두 배에 달하는 28.29센트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올바르게 인정 받지 못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결과입니다.
애리얼리는 '일의 의미'가 생산성과 유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인 하버드 대학 학부생들에게 바이오니클(Bionicle)이라 불리는 레고 블럭을 조립하도록 하고 처음 완성하면 2달러를 주고 그 다음 회부터는 매회 11센트씩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학생들을 몰래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의미 그룹'의 학생들은 바이오니클 하나를 완성하면 책상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었고 실험진행자로부터 새로운 세트를 건네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노동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죠. 반면 '시지푸스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말 그대로 시지푸스처럼 무의미한 반복 작업으로 느껴지는 상황에 처해야 했습니다. 바이오니클을 만들자마자 실험진행자가 냉정하게도 그것을 바로 부수어버리고 다시 만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실험 결과, 의미 그룹의 학생들은 평균 10.6개의 바이오니클을 완성했지만, 시지푸스 그룹의 학생들은 7.2개 밖에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빨리 포기를 선언했다는 말이죠. 의미 그룹은 수고료 수준이 1.01달러가 될 때 그만하겠다고 말한 반면, 시지푸스 그룹은 1.40달러일 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시지푸스 그룹의 학생들이 그만큼 자신의 유보 임금을 40% 높게 설정했음을 뜻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성과를 달성했더라도 그게 자신과 조직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지 못할 때, 생산성이 저하되는 반면 유보 임금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을 이 실험이 확실하게 규명해 준 셈이지만, 이로써 인정 받고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기여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비자발적으로 돌아서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유보 임금을 주장하겠죠. 임금 수준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 불만은 '무인정'과 '무의미'에 지치고 소외 받은 직원들이 그 상실감을 돈으로나마 보상 받으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에서 기인한 것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성과관리는 직원들에게 밀착하여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행동을 수정하도록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룬 성과를 나름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그 성과가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대의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인식케 하는 일임을 이 실험의 결과가 시사합니다. 직원이 현재의 업무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가 잘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일이 KPI를 수립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목표 세우고 평가해서 줄을 세우는 것은 성과관리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측정에 불과합니다. 측정보다는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춰 성과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임금을 제법 괜찮게 주는데 이상하게도 줄어들지 않는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논문)
Man’s search for meaning: The case of Le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