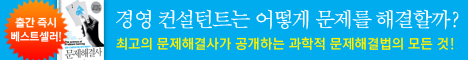여러분이 작성한 보고서에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수학 공식 하나를 집어 넣으면 그 보고서를 읽는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꼭 수학 공식이 아니어도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사칙연산이 포함된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보고서의 신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제품의 매력은 제품 자체의 기능성과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감성으로 결정된다고 말로 표현하면 될 것을 '매력 = 기능성 X 감성적 어필'이라는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면 독자가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순수수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던 스웨덴 멜라르라덴 대학의 킴모 에릭손(Kimmo Eriksson)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수학 공식이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는 수학 공식이 들어갈 법 하지 않은 인문학이나 교육학 등의 논문에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수학 공식이 집어 넣을 경우에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에릭손은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2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뽑은 2개의 논문 초록을 읽게 한 다음에 논문의 질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의 논문 초록은 수렵 채집 부족 내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논문 초록은 교도소 수감이 백인 구직자와 흑인 구직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논문 모두 수학과는 거리가 멀었죠. 참가자 중 절반은 마지막 부분에 'TPP=T0−fT0df2−fTPdf' 라는 수학 공식이 포함된 초록을 읽었고, 나머지 절반은 수학 공식이 없는 (원래의) 초록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공식은 논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무 의미 없는 수학공식이 포함된 논문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인문학 분야의 전공자들의 편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학 공식이 있는 논문을 수학 공식이 없는 논문보다 70퍼센트 이상 높게 평가했죠(수학 관련 전공자들고 45퍼센트 이상 높게 평가함). 이는 수학에 관한 스킬이 부족할수록 의미 없는 수학 공식이 추가된 논문의 질을 올바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소위 '수학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수학 공식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일종의 경외감을 선사하는 모양입니다.
에릭손의 실험은 여러분의 보고서가 독자(보통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트릭 한 가지를 알려 줍니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수식을 가미하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보고서의 내용을 수학 공식으로 요약하는 것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일러주죠. 오늘 결재를 맡거나 발표해야 할 여러분의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 보고 수학 공식이 가미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면 어떨까요? 밑져야 본전 아닐까요? ^^
(*참고논문)
Kimmo Eriksson(2012), The nonsense math effect,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Vol.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