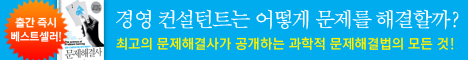여성은 집에서 애들이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남성이 해야 할 일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성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직업 세계에 여성들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지요? 여성들에게 가장 적당한 직업은 요리사, 간호사, 교사일까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정말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런 성차별적인 질문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겁니다. 이 블로그의 방문자분들은 훌륭한 양성평등주의자(혹은 페미니스트)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함정에 걸려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차별적인 질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한 후에 누군가가 성(gender)과 관련된 판단 과제를 제시하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성차별적인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수록 나중에 편견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그럴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이는 베누이 모닌(Benoît Monin)의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닌은 200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질문 5개를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멘트 회사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직원을 뽑는다는 가상의 사례를 참가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지원자가 고객과의 협상력, 공사 감독과 건설회사와의 친화력, 전문 기술 등이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직원이 적합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겼죠. 모닌은 참가자들에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이 포지션에 적합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5개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임을 강하게 유도 받은 참가자들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참가자(사전에 질문를 제시 받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시멘트 회사에 근무할 사람은 남성이어야 한다는 대답을 더 많이 내놓았습니다. 분명히 여성 차별적이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성성이 강한 직업에서 여성을 더 많이 배제하려 했던 겁니다.
후속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닌은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원하는 지원자 5명의 이력서를 보여주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는 과제를 참가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지원자들 중에는 유일하게 백인 여성 1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나머지는 모두 백인 남성), 명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에 누가 봐도 다른 지원자들보다 매력적으로 보였죠. 이런 조건 하에서 참가자들은 '나는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받았거나 '나는 여성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닌이 첫 번째 실험에서 제시했던 시멘트 회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참가자들은 이런 조건에 노출되지 않은 참가자들(지원자 5명 모두가 백인 남성이라는 조건을 접한 참가자들)에 비해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모닌은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에 대한 편견 상황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했는데,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없음을 사전에 자극 받은 참가자들이 신임 경찰관으로 흑인보다는 백인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렇듯 성, 인종,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자극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판단과 행동이 편견에 빠지고 마는 현상, 간단히 말해 편견이 없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편견에 의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현상, 이를 심리학에서는 '크레덴셜 효과(Credentials Effect)'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직전의 말이나 행동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자신하거나 느낄수록 그 다음의 말이나 행동이 편향적이어도 된다는, 일종의 자격(credentials)을 부여 받는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해도 된다고 여긴다는 '도덕적 허용(Moral licensing)'이란 개념과 크레덴셜 효과를 연결하면 평소에 양성평등을 외치던 사람이 엉뚱하게도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희롱를 저지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편견이 없다고 자신하면 오히려 편향된 행동이 강화되는 현상. 인간의 심리는 알면 알수록 오묘합니다. 여성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기업일수록 알게 모르게 차차 여성 인재(혹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또한 기업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곤 하는데 크레덴셜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라지 않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참고논문)
Benoît Monin, Dale T. Miller(2001), Moral Credentials and the Expression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1(1)